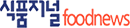신동화 명예교수의 살며 생각하며(293)

내 어린 시절 나를 키워주었던 시골, 내 고향을 생각할 때마다 따뜻한 훈풍이 가슴속을 가득 채운다. 위 아래채, 초가집에 할아버지, 할머니를 모시고 부모님, 그리고 형제, 자매들, 한동안 삼촌과 사촌들까지 한 지붕 아래서 생활했으니 지금의 젊은이들은 상상도 못 할 대 가족, 거기에 농사일을 도와줄 분들까지 같이 밥상을 받으면서 살았다. 참으로 다복하고 따뜻하면서 아늑한 가정생활을 하였다. 큰 부엌에는 무쇠솥이 2개가 나란히 자리 잡고 조금 큰 쪽은 밥, 작은 솥에는 여러 다른 국을 끓이는 데 사용하였다. 겨울에는 일찍 일어나 한 솥 가득 물을 부어 따뜻하게 데워 가족들의 세숫물로 쓰게 하였다. 어머님의 살뜰한 배려로 겨울도 따뜻한 물로 세수할 수 있었으니 그 온기가 지금도 내 살갗에 남아있다.
몇 대 장손 집안이라 선조를 모시는 제사는 아마도 매달 1~2번 돌아오는 것으로 기억한다. 3대까지 모셔야 하고 대가 끊긴 조상까지 챙기셨으니 어린 우리야 얼마나 즐거운 일인가. 제사 며칠 전부터 제사장에 쓰일 유과며 강정 등 귀한 음식을 맛보고 제사 당일에는 제사 후 평소에 맛보지 못하는 산적 등 음식을 골고루 맛있게 먹을 수 있으니. 잊지 못하는 것은 달고 말랑말랑한 곶감의 맛이라니. 감이 나오는 제철 외에는 항상 곶감이 시(柿)를 대신하였으니. 우리 할머니와 어머니는 조상제사를 모두 정성스레 준비하셨고 제사 전날에는 목욕하시고 깨끗한 몸과 마음으로 제사음식을 준비하여 제상을 차리셨다. 어린아이들도 행동을 조심시켜 제사의 경건함을 느끼도록 배려하셨다.
시골에서는 사계절, 24절기를 그냥 넘기는 적은 없었다. 할아버님은 항상 책력을 옆에 놓고 계시면서 음력으로 치는 24절기를 꼬박꼬박 챙기셨다. 특히 지금도 생각나는 입춘 날에 입춘 방을 정성스레 한지에 먹물을 담뿍 묻힌 붓으로 입춘대길(立春大吉), 건양다경(建陽多慶)을 써서 손자들에게 건네 대문이며 각 방 출입문 옆 기둥에 붙이도록 하였다. 특히 부엌에는 정조오미 반등팔진(鼎調五味 盤登八珍)을 써서 큰 방 부엌에만 붙였다. 솥에서 5미가 조리되고 소반 위에 팔방의 진수성찬이 오른다는 뜻. 맛을 내는 가장 중요한 장소에 모두의 바람을 표현했다고 생각한다. 지금도 立春大吉 같은 입춘 방이 붙어있는 집을 보면 옛날이 생각나 새삼 정겹다. 그 말대로 그 집에 경사가 겹치고 길한 기운이 함께하길 마음속으로 빌어 준다. 새봄이 찾아오는 입춘이지만 겨울의 끝에서 아직은 찬바람이 차고 시린데 새벽같이 꼭 이 입춘 방을 붙이는 것은 당시 고역의 하나였으나 그 추억이 없다면 지금 맞는 입춘의 정겨운 생각의 뿌리가 있겠는가, 하면서 다행스럽게 여기고 있다.
정월 초, 처음 맞는 뱀 날, 뱀 사(巳)가 들어간 날이다. 그때만 해도 미루어 짐작하기에 우리가 사는 집 근처에 뱀이 자주 나왔나 보다. 뱀 방이라고 하여 이삼만(李三晩) 이름이나 백사(白巳), 청사(靑巳)라고 백지에 써서 거꾸로 외진 벽이나 기둥에 붙였다. 뱀이 보기 쉽게. 이삼만은 자기 아버님이 뱀에 물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원으로 뱀을 보는 족족 죽여서 뱀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이름이 되었고 그 이름을 뱀에게 알려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주술적 힘을 이용하였다. 이런 절기의 풍습은 그대로는 아니더라도 그 뜻을 이어받을 풍습에 담긴 정신을 간직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루어질 수 없는 생각을 한다.
우리 민족의 정신문화 저변에 깔린 생각을 되살리고 이어 가는 것은 긴 역사를 품은 문화민족임을 증명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칠월칠석, 그네뛰기는 한참 발랄한 처녀들의 즐거운 놀이였고 하루를 즐겁게 보내는 나름의 젊은이 명절에 속하였다. 1월 보름, 일 년 중 가장 큰 보름달을 볼 수 있는 날, 쥐불놀이는 지금도 잊지 못할 추억들이 겹겹이 쌓여, 이어서 나온다. 지금은 산불로 금기된 행사가 되었으나 어릴 때 밤에 나가 쥐불놀이와 불통 던지기는 얼마나 즐거웠는지. 그리고 보름날 저녁은 동네 간 줄다리기 시합을 하며 즐거운 잔치 분위기를 더하였다. 이웃 동네의 남녀노소가 모두 모여 남녀로 편을 가르고 줄다리기를 하며 여자 측이 이기면 그해 풍년이 든다고 믿었다. 이럴 때 어찌 장구와 꽹과리가 앞서는 농악이 빠질 수 있으랴. 그 흥겨운 가락에 모든 참가한 사람들의 어깨가 들썩거리는 흥의 한마당이 되었다. 인위적으로 연습하여 놀이한다기보다는 평소 했던 그대로 꾸밈없이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말 그대로 흥을 돋우는 즉석행사, 그런 모습들이 선하게 떠올라 시골에서 생활했던 어린 시절이 나에게 있었다는 것에 지금, 이 순간도 무한 행복에 젖고, 감사할 따름이다.
다시 그때로 되돌아갈 수는 없지만 잊히지 않는 나만의 보물로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고 있다.
관련기사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식품저널 foodnews를 만나세요. 구독하기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