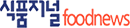신동화 명예교수의 살며 생각하며(299)

한동안 우리 집 마루 밑에는 나무로 만든 나막신이 있었고 비가 올 때는 가끔 유용하게 신고 다녔던 기억이 있다. 스스로 자기에 발에 맞는 신발을 신는 동물은 사람밖에 없을 것 같다. 하긴 애완동물 중 개에게는 깜찍스러운 신발을 신기는 것을 보았으나 그것도 주인이 만들어준 것이고 다른 동물은 신발 대신 자기 발을 스스로 보호하는 질긴 피부가 있다. 소에게는 발톱이 닳을까봐 주인이 짚으로 만든 짚신을 신겨주어 자기 신발이 된다. 고분에서 발견되는 왕들의 유물 중 금으로 장식된 신발이 발견되나 그것은 실생활에서 사용했다기보다는 상징적 장식물이 아니었을까 생각된다.
우리 생활에서 신발을 사용한 역사는 원시시대야 맨발이었겠으나 문명이 발달하면서 발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신발이 필요했고 그 필요에 따라 여러 재료가 이용되어 신발이 만들어졌을 것이다. 우리의 경우 일찍이 주위에서 가장 쉽게 구할 수 있는 짚을 이용한 미투리 짚신이 제일 처음 서민의 신발이 되었을 것이다. 물론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동물의 가죽을 이용한 가죽신을 신었고 명주를 이용한 꽃신도 있었다. 미국 인디언도 사슴가죽신을 만들어 사용하였는데 그 이름을 모카라고 불렀다. 지금도 모카신이 이용되고 있으며 단장을 하여 외양이 아름답게 꾸몄다.
개인적인 경험을 더듬어 보면 우리는 고무신 세대로 왜정을 거치면서 인공 합성고무가 세계적인 상품으로 되면서 고무신발은 일상생활에서 필수품이 되었다. 대부분 검은색, 검정고무신이었으며 조금 여유가 있다면 좀 값이 비싼 흰 고무신을 신었다. 옛날 지방에서 과거시험을 보러 가는 유생의 괴나리봇짐 위에는 당연히 몇 켤레의 짚신은 얹혀 있었는데 이는 몇백 리를 걸어서 가야 할 경우 닳아 없어지기 쉬운 짚신은 가는 길에 구매할 수 없었으니 자연 미리 준비하는 필수품목이 되었을 것이다.
초등학교에 다닐 때만 해도 모두가 검정고무신을 신었고 일부 여유가 있는 학생의 경우 운동화를 신었으나 한 반에 한두 명꼴이었다. 내 경우 중학교 입학 기념으로 선물 받은 운동화가 어찌나 소중하던지 학교 갔다 와서는 바로 벗어 방안에 모셔놓고 다른 일을 할 때는 고무신으로 갈아 신었다. 수십 년이 흐른 지금도 처음 신었던 운동화의 모습이 아른거린다. 고무신은 물에 젖지 않으니 농촌이나 시골 생활에서는 얼마나 편리한 신발이겠는가.
검정 고무신이 나오고 나서 한참 후에야 색깔 있는 고무신이 상품화되어 일반인의 눈길을 끌었고 대부분은 검정고무신이 일반인의 가장 접근하기 쉬운 편한 신발이 되었다. 고무신은 맑은 날이나 비 올 때를 불문하고 편하게 항상 신을 수 있으며 벗고 다시 신을 때 얼마나 편리한가. 한 가지 불편한 것은 겨울 눈 올 때 눈이 신발에 넘어 들어오는 것을 막지 못하여 꽤 걸어서 학교에 가야할 때 눈이 넘어 들어 신고 있던 양말이 젖어 시린 발로 공부를 해야 했던 기억이 남아있다. 초등학교 저학년에는 시멘트 바닥에서 공부했으니 신발을 신고 교실에 들어갔고 고학년이 되면서 마루가 깔린 교실, 당연히 신발장에 신발을 벗어놓고 교실에 들어갔다. 이때도 신발장이 처음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고 한참 지난 후 신발장에 신발을 벗어놓을 수 있었다. 그러기 전에는 신발주머니를 항상 갖고 다니면서 교실에 들어갈 때 신발을 벗어 신발주머니에 넣어 책상 옆 못에 걸어놓곤 했다. 그래서 학교에 갈 때 신발주머니는 필수품이었고 무명으로 만든 주머니는 책보를 싸는 옆에 항상 준비하였다.
신발의 변화는 가히 우리나라 문명발달사와 함께하였고 그 변화도 일반생활에 크게 영향을 미쳤다. 시대가 바뀌면서 의상과 함께 신발도 크게 변하여 대부분 성장하여 사회생활을 할 때는 구두로 바뀌었다. 이 수요에 맞춰 구두제조회사가 큰 기업으로 성장하였다. 고무신과 비교하여 구두의 단점은 발이 새 구두에 적응하기 위하여 상당 기간 곤욕을 치르는 시기를 거쳐야 했다. 맞춤도 있었으나 대부분 값이 싼 기성화를 신었기 때문에 발볼에 구두가 잘 맞지 않아 발가락이 구두 모양에 맞춰가다 보니 기형이 되기도 하였다. 이런 불편을 이기기 위하여 다시 운동화로 돌아가는 추세가 근래 뚜렷해졌다. 시내에 걸어 다니는 사람의 80% 이상은 운동화이고 특별한 행사 때 외에는 거의 편한 운동화가 일반화되고 있다.
신발의 변천사가 우리 인간, 아니 우리나라 사람들의 일상생활 변화와 궤를 같이하고 있다. 어찌 신발뿐이랴. 입는 옷의 변화는 너무나 크게 변하여 고유한 한복은 이제 특별한 행사나 외국 관광객이 이 나라 풍속을 경험하는 복장이 되었고 머리의 모습은 더 큰 변화를 보이고 있다. 조선 초 후반, 단발령을 기점으로 상투가 없어지고 갓이 사라졌으며 서양식 모자가 머리를 보호하는 수단이 되었다. 이런 변화가 겨우 지난 100년 사이에 급격히 일어났다. 내가 지금 신고 있는 신발을 내려다보면서 지나온 세월을 다시 생각하며 앞으로 어찌 변할까 궁금해진다.
신동화 전북대 명예교수
관련기사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식품저널 foodnews를 만나세요. 구독하기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