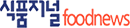신동화 명예교수의 살며 생각하며(301)

살아있는 모든 사람은 목적하는 일을 하기 위해 장거리건 단거리든 걷지 않고는 생활할 수 없다. 아무리 자가용으로 모신다 해도 차를 내려 사무실 찾아가는 길, 생리적 문제를 해결하거나 세끼 밥을 먹기 위해서는 자기 발로, 멀든 가깝든 식당까지 걸어야 한다. 또 일터에서는 하루 내내 발로 움직인다. 운동량이 부족한 현대인에게 걷기는 운동 부족을 보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 강조하고 있고 육체적으로 노쇠기에 들은 사람들에게는 무리하지 않고 능력에 맞는 운동으로 걷기만큼 적당한 운동은 없을 것이다. 이 걷기는 사람에 따라, 건강상태나 나이 먹은 정도에 따라 혹은 여건에 따라 그 속도가 다르다. 습관적으로 빨리 걷거나 늦게 걷는 차이는 있지만, 생활에서 필수로 걷기는 생존의 일부다. 걷기를 통해서 다리근육이 보강된다.
이 덕으로 건강을 유지하는, 이 걷기 속도를 지역별, 도시별로 분석한 결과는 과문한 탓인지 보지 못하였다. 개인 업무나 공적인 일로 서울과 대도시, 그리고 중소도시를 방문하는 기회가 가끔 있다. 각기 다른 도시를 방문할 때마다 길거리 지나다니는 행인의 걸음 속도를 나름대로 가늠해본다. 물론 젊은 사람과 나이 든 분과는 분명 차이가 있겠지만 그 차이는 지역별 비교를 하는데 큰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 나도 같이 그룹 지어 비교하면 되니 딱 부러지게 스톱워치를 놓고 1분당 걸음 수를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 걸음 속도와 비교 그리고 감각을 동원하면 어림짐작하여 비교가 가능할 것으로 여긴다.
대표적인 대도시, 서울 시내에서 움직이는 행인의 발걸음을 가늠해보자. 다른 지역에 비하여 남녀노소 구별 없이 꽤 빠르다는 것을 느낀다. 내 걸음도 나이에 비하여 그렇게 빠지는 쪽은 아닌데 아침 출근길 내 옆에 걷고 있는 사람의 2/3는 나를 앞질러 간다. 더 빨리 걷는다는 의미다. 물론 불편하거나 나보다 더 나이 든 분은 내가 앞지르지만 그렇지 않은 행인은 확실히 나보다 빠르다. 그러나 중소도시에 가면 상황이 상당히 다르다. 내 걸음걸이 속도는 다른 보행자에 비하여 확실히 평균을 넘는다. 상당한 행인이 나와 비슷하거나 느린 속도로 걷는다. 그만큼 보행속도가 서울에 비하여 느리다는 얘기가 된다.
이제 읍면지역으로 장소를 옮겨보자 걷는 행인들이 많지는 않으나 여유가 있다. 아마도 젊은 사람들의 분포가 월등히 낮아지기는 이유도 있겠으나 그래도 기준을 비교적 젊은 편에 드는 사람을 기준해도 내가 평소에 걷는 속도보다도 떨어진다는 것을 느낀다. 아직 잘 설계된 계획과 숫자로 비교하는 것은 아니지만 내 걸음 속도를 기준으로 비교해본 결과는 서울>대도시>중소도시>읍면 순이었다. 느낌이 아니라 실제 걸음걸이의 속도를 나와 비교해본 결과이고 그 순위를 매겨본 것이다. 이렇게 대도시와 소도시의 거주인들 보행속도가 다른 이유는 무엇일까. 생활의 여유 아닐까 나름대로 생각해본다. 세계적으로 빨리빨리가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말이라 외국인들이 지적한다는데 그 빠름이 모든 생활에서도 적용하다 보니 걸음걸이도 그것에 비례하는 것 아닌가 미루어 짐작해 본다. “빨리”, “빨리”는 서두는 것의 대명사이긴 하지만 일 처리에서도 신속함을 의미한다. 이런 생각이 기초가 되어 한국이 세계 유례가 없는 발전을 하였고 어찌 보면 몇 단계를 도약, 발전해 온 원동력이 아닐까 생각한다.
도시의 발전도 보행인의 걸음 속도와는 관계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추론해본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근무자들의 보행속도도 비교해보면 좋은 대비가 되지 않을까 하는데 비교 대상 선정이나 보행속도 측정에서 객관성을 갖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다. 이제 여행할 기회가 있으면 스스로 자기를 기준으로 지역별 보행자를 관찰하면서 나름대로 보행속도를 비교해보는 것도 여행을 즐기는 한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한다. 우리는 사는 지역과 주어진 자연환경, 여건 그리고 현재의 내 처지에 따라 움직이는 속도도 달라질 것이라 어렴풋이 느끼고 있다.
신동화 전북대 명예교수
관련기사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식품저널 foodnews를 만나세요. 구독하기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