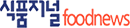신동화 명예교수의 살며 생각하며(304)

여름을 지나 가을 초입, 돌담을 타고 올라가 넓게 자리 잡는 무성한 호박 줄기, 탐스러운 잎과 황금색 꽃 그리고 이미 애호박의 틀을 벗고 부드러운 노란빛을 내는 늙은 호박, 시간의 흐름을 한눈에 보이는 광경이다. 호박 줄기 끝에는 앳된 잎이 햇빛을 받고 있다. 어머니는 대바구니를 한 손에 들고 호박순 중 앳된 잎을 골라가며 딴다. 조금 까칠까칠하지만, 이 순을 데쳐놓았을 때는 그 감은 훨씬 덜 하다. 풀기 없이 숨죽인 어린 호박잎은 강된장과 만나야 제격이다. 우리 전통된장을 되직하게 끓여 여기에 햇고추를 넣고 필요하면 약간의 고추장을 풀면 한결 다른 맛이 난다. 데친 호박잎을 손 위에 놓고 강된장 반 숟갈, 그리고 찰진 밥을 알맞게 얹으면 준비 완료. 맛이 없을 것 같던 호박잎 쌈이 이런 또 다른 맛을 낼 줄이야. 맛의 조화다. 무미의 호박잎이 강된장국과 밥이 어울려져서 완전히 새로운 맛을 낸다. 이 음식은 꼭 이 계절에 먹어야 제맛을 낸다. 더욱 어머니가 이른 새벽이슬 머금은 호박잎을 금방 따다가 빠르게 데치고, 준비한 강된장이면 금상첨화다.
며칠 전 이웃집 할머니가 자기 농장에서 키운 호박에서 따온 호박잎을 한 움큼 보내주었다. 물씬 옛 기억이 내 머리를 채운다. 같이 따라오는 그리움이 베인 어머니의 자애로운 얼굴이 뒤따른다. 옛 추억을 되짚어보려 아내가 조리한 데친 호박잎을 손에 올려놓고 상품으로 나온 전통된장으로 만든 강된장을 한술 떠서 얹는다. 손에 닿는, 데친 호박잎의 촉감은 그대로인데 먹는 입의 감각은 옛 맛이 아니다. 모든 것이 같은데 단지 내 입이 달라졌고 분위기가 시골집, 옛 정취가 아니었기 때문이 아닐까.
어린 호박잎은 이 시대 성인들에게 부족한 양질의 식이섬유를 공급하면서 특히 비타민류의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여겨진다. 우리 조상들은 계절에 따라 생산되는 식재료를 정성스레 골라 식탁에 올리고 그 재료들이 우리 건강을 지키는 버팀목 노릇을 하였다.
호박은 가장 탐스러운 것이 노란색 늙은 호박이다. 수풀이 우거져 애호박으로 이용되지 못하고 늙음을 맞아 온전히 모양을 갖춘 모습, 줄줄이 골이 졌고 틀스러운 호박 꼭지는 손으로 쥐고 나르는 데 전혀 문제가 없다. 특히 서리 오기 전 주먹 크기보다 더 작은 애호박이 달린 순을 통째로 잘라다가 된장국을 끓이면 그 맛이 또한 별나다. 지금이야 먹을 것이 넘쳐나니 구태여 호박순까지 먹을 필요가 있느냐고 갸우뚱거릴 사람도 있겠으나 이 시기에 마트에 가면 호박순에 작은 애호박이 붙어있는 호박순이 상품으로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아직도 그 옛 추억을 가슴에 품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동료의식을 느낀다.
옛 음식, 내가 어릴 때 나를 키워주었던 추억의 음식들, 자금도 내 몸 유전인자에 각인되어 결코 잊지 못하는 옛 음식들이 정답고, 그 음식과 똑같지는 않지만, 그 음식을 먹은 날은 나도 모르게 힘이 솟는 느낌을 받는다. 계절을 잊은 과일, 채소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시장의 모습에서 한 철만 즐겼던 향수를 되살릴 수 없지만 그래도 옛날 먹었던 그 감정은 다시 느낄 수 있어 다행이다.
과학은 우리가 먹은 음식이 각자의 유전인자에 영향을 주어 그 맛과 영양에 그대로 반응한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후성유전학이라고 하며 음식이 내 유전인자 구성에 영향을 주고 있으니 어릴 때 먹은 음식에 대한 기억은, 그 기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본능에 속한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구수한 된장에 각인된 우리 세대는 어느 때고 그 맛과 향에 끌리는 것은 본능에 속한다. 우리 전통 발효식품이 세계 식품화 되고 있는 이 현상을 조금 오래 끌면 세계인의 유전인자에 우리 음식을 각인시키는 역할을 할 것이다. 특히 다음 세대를 겨냥하여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한국 전통음식을 자주 접하게 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데친 호박잎을 좋아하는 것은 숨겨져 있던 깊은 내 마음속 바닥에서 나온 반응이다. 지금도 별미를 느끼고 즐길 수 있게 키워주신 우리 어머니를 다시 떠올린다.
신동화 전북대 명예교수
관련기사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식품저널 foodnews를 만나세요. 구독하기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