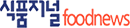신동화 명예교수의 살며 생각하며(309)

어느 일간지에 쓰인 글, “엄마 음식을 떠난 아이들”. 엄마가 정성을 다하여 만들어 보내준 음식을 그대로 냉장고에 쑤셔 놓은 걸 본 엄마의 섭섭한 심정을 표현하고, 그렇게 변한 세상을 섭섭해하고 있다. 그렇다. 세대에 따라서 어머니의 음식을 대하는 태도는 달라질 수밖에 없다. 지난 조선조 500년간 대가족 제도에서는 이동이 별로 없이 이웃집 아니면 한동네에서 살았고 기껏해야 조금 떨어진 동네로 시집을 가거나 제금(분가)을 해서 독립 살림을 하도록 배려하였다. 그러니 먹는 음식은 어머니 방법이 딸대로, 대대로 이어지고, 음식을 만드는 재료 또한 지역 생산품으로 한정되어 있으니 같은 재료로 만드는 음식은 크게 다르지 않고 유사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주식은 쌀과 보리, 일부 잡곡 등을 이용하여 밥을 지었고 밥 먹을 때 필요한 반찬은 채소를 절이거나 발효한 것, 나물무침 또는 조림이나 튀김 등으로 크게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고 간을 하기 위한 콩을 발효한 장류는 한국음식의 근간을 이루는 재료가 되었다. 육류재료는 집에서 키우기 쉬운 닭, 오리, 돼지, 개, 염소 등 소동물, 조금 나가면 소이겠으나 소는 한 집안의 재산 1호라 감히 쇠고기를 먹을 생각은 엄두도 내지 못하였다.
조금 눈을 넓히면 해안에서 잡아 염장한 고등어, 갈치 등이 밥상에 오르나 그 요리방법 또한 그렇게 다양하지 못하였다. 지금 전해지는 우리 한식의 꽃, 한상차림은 특별한 귀족 집안의 얘기고 임금님의 밥상도 구첩반상, 기껏 호사를 부려봤자 12첩으로 이들 음식 또한 소박하였다. 정조의 수원 행궁도에서 기록된 음식상은 우리 서민의 생활상을 볼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되고 있다, 우리 음식의 특징은 곡류를 끓여 밥을 짓고 여기에 김치, 장류 등 발효한 반찬류가 중심이 되었다. 특히 채소류를 절여서 발효한 대표 식품인 김치류는 우리 민족의 역사와 얼이 깃든 음식의 하나가 되었다. 또한, 탕은 끓임의 진수로 새로운 맛을 내는데 아주 이상적인 조리 방법이었다. 이렇게 우리 조상들은 제한된 식재료를 이용하여 다양한 음식을 만들어 먹었고 삶의 형태는 대단히 가까운 거리에서 서로 소통하면서 살았다. 더욱 음식의 동질성을 유지할 수 있는 것 중 가장 중요한 이유는 먹을 것의 부족이었다. 한정된 자원으로 음식을 만들어 먹었고 그것도 항상 부족하였다. 내가 살았던 동에만 하더라도 춘궁기에는 끼니를 잇지 못하는 이웃이 있어 한 끼 밥을 해결하기 위하여 새벽에 여유 있는 집의 일을 도와주고 자기 아침과 처자식 먹을 것을 얻어다 먹여 주곤 하였다.
지금과 같이 먹을 음식이 넘쳐나고 국내외에서 조달하는 식재료가 다양한 상황에서는 음식을 나눠준다는 것은 그렇게 환영받지 못할 일이 되어버렸다. 내 경우는 지금까지도 어머니가 끓여주셨던 그 구수한, 애호박을 채 썰어 넣고 끓인 된장국, 그 맛이야말로 어머니를 다시 뵙는 기분이 들지만, 딸애는 이 된장국을 거들떠보지도 않는다. 어머니가 해주셨던 어릴 때 그 음식은 이제 한물간 퇴물의 음식이 되었고 그 옛 음식을 되돌려 좋아하는 음식으로 만들 요인을 찾기가 어렵게 되었다. 그런데 이런 큰 시대의 흐름을 느끼지 못하고 옛 기억 속에 살고 있는 어머니는 아들, 딸을 위해 그들이 클 때 즐겨했던 음식을 만들어 보내주나 아들, 딸이 그 음식을 좋아할까. 회자되는 얘기는 명절에 시집에 갔다가 돌아올 때 시어머니의 정성이 담긴 음식꾸러미를 휴게소 쓰레기통에 버리고 온다는 말이 회자기도 한다. 며느리가 도착할 즈음 시어머니가 전화하여 음식꾸러미에 넣어놓은 용돈을 손자에게 주어라는 얘기에, 아차 했으나 되돌 수 없는 상황. 이제 옛 음식은 그것 자체로 의미가 있으나 신세대에게 이를 강요한 아무런 동기가 없어져 버렸다. 배고픔이 아니라 너무 먹어서 문제인 이 시대에 음식을 싸서 보내주는 것을, 심하게 얘기하면 쓰레기를 양산하는 결과가 되어버린 시대가 되었다.
시대가 이렇게 변했는데도 우리 부모는 지금도 자식들의 먹을거리를 걱정하고 밥 잘 먹었냐고 묻는 것이 일상의 인사다. 음식을 싸서 전달하는 그 마음은 결코 음식 자체에 있지 않다. 그 음식을 만든 정성과 주는 마음. 그 마음이 담겨있는 상징적인 징표이다. 이 세상이 아무리 변하고 다른 환경이 되어간다 해도 부모가 자식을 생각하고 사랑하는 그 정은 결코 변하지 않을 것이다. 그 마음을 받아들일 가슴에 여백이 없는 자식들의 처지가 야속하기는 하나 그 자식도 자기 자식에게 꼭 같이 베풀고 그 베풂을 똑같이 섭섭하게 받을 테니 세상은 공평한 것이 아닌가. 생활환경이 너무나 빨리 변하고 이에 따라 인간의 속성도 이를 따라가니 머릿속으로 아쉬운 감정이 드나 어쩌나, 인간사 큰 흐름을 거역할 수 없음을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으니.
신동화 전북대 명예교수
관련기사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식품저널 foodnews를 만나세요. 구독하기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