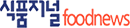신동화 명예교수의 살며 생각하며(287)

이 지구, 좀 더 가까이 내 주위에 있는 생물이나 무생물, 어느 것 하나 순간순간 변하지 않는 것이 있겠는가, 생명체는 말할 것 없고 무생물이 그 단단했던 바위도 풍화작용으로 그 견고함을 잃고 부서져 가루로 되고 흙먼지로 변하는 것을 보고 있다. 단지 시간이라는 요물에 묻혀 쳐다보니 지금의 형체가 그대로 영원할 것처럼 느낄 뿐이다. 변화의 극치는 아마도 생명체일 것이다.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달라지는 모습을 우리는 무심하게 보며 지나친다.
어제는 쌀쌀한 이른 봄 날씨에도 초봄의 전령사, 진달래꽃이 활짝 피었고 그 옆 화단에는 개나리 꽃봉오리, 노란색이 진하게 앳된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다. 원추리는 이미 새싹을 반 뼘 정도 밀어 올려 제 꼴을 갖추고 있다. 이들 모두는 작년과 모습을 같지만, 어찌 지난해 것이겠는가. 벌써 가버린 그 흔적 밑에 숨겨 놓았던 새 생명체가 대신하고 있다. 이들도 일주일이 지나면 꽃의 형태나 그 여린 잎사귀의 모습도 달라질 것이다. 변화의 양상은 참으로 신비하면서도 자연의 순리를 눈으로 보이게 알려주고 있다. 이런 변화의 모습과 함께 이를 보고 있는 나는 작년의 나인가? 어림도 없는 상상, 벌써 1년을 나이 먹었고 기력도 지난해보다는 달라졌음을 스스로 느낀다.
인간의 일생을 한번 생각해보면 변화의 정형을 스스로 보여주고 있다. 어찌 보면 지나온 과정에서 정점을 지나 다시 역으로 살아왔던 길을 되돌아간다고 느낀다. 어머니의 몸에서 떨어져 나와 독립 개체로 성장하는 과정을 진보의 발전 과정이나 한 고개를 넘고 나면 쇠퇴의 길로 접어들어 정리하는 과정에 접어든다. 태어나서는 겨우 손발을 움직이고 이틀 정도 지나야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을 뜰 수 있다. 기저귀를 차지 않으면 대소변을 처리할 수 없고 먹이는 어떤가. 어머니 젖무덤이 입에 닿아야 제 먹이를 얻을 수 있다. 제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손발 움직이는 것과 배고프거나 불편하면 울음으로 알리는 것 외에 방법이 없다. 울음 대신에 미소를 띠기 시작하면 부모나 가족들의 환성이 터진다. 드디어 인간으로서 특징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지구상 어느 동물이 아름다움과 만족의 표현, 미소나 웃음이 있겠는가.
어린애가 조금 자라면 스스로 뒤집고 기어 다니는 모습을 얼마나 경이로운 모습으로 보는가. 대소변을 가리는 때가 되면 드디어 한 인간으로서 체면을 갖춰간다고 기뻐한다. 그리고 걸어서 다음 단계 뜀박질이 가능해지면 우리는 스스로 살아갈 힘을 비축했다고 여긴다. 이 과정은 성장하는 모습이고 그 누구도 한 단계를 뛰어넘을 수 없는 순서에 따른 절차이다. 젊음, 얼마나 찬란해 보이고 값진 시간인가. 모두가 부러워하고 찬사를 보내는 시간, 세상이 모두 자기 것인 양 포부를 크게 갖는 시기. 이 기간에 우리는 많은 것을 이룬다. 평생 쌓아야 할 업적을 이루어 가정을 갖고, 가족을 만들고 이들은 부양할 의무를 즐거움으로 알고 이 의무에서 행복을 만든다.
이 과정이 모두 순탄한 것은 아니지만 마음먹기에 따라서는 나에게 주어진 시간과 여건을 긍정적인 면으로 바꿀 수 있는 지혜도 필요한 시기이다. 같은 상황에서도 긍정적으로, 부정적으로 보는 것은 각자의 나름 생각이지만 한정된 우리 시간에서 결코 부정적인 생각이 들지 않도록 나를 다잡아 보는 것도 삶을 행복하게 살아가는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이런 일들이 모두 잘 될 거야. 그리고 나에게 도움이 되게 변화되겠지 하고 믿음을 가지면 실제 마음이 안정되고 평화로운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많다. 성현들 말씀의 진수는 내 운명은 마음가짐에 따라 변한다는 것을 누누이 강조하고 있다. 마음먹기 달렸다는 얘기를 허투루 지나갈 격언이 아니다.
젊음의 찬란한 잠깐의 시간이 지나면 정상에서 내려오듯 육체적 약화는 물론이고 정신력도 예 같지 않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 그렇다. 이 모든 것이 자연의 섭리이고 시간이 주는 변화임을 그 누가 피해갈 수 있겠는가. 노쇠의 과정을 지혜의 축적을 등반하기도 하나 어릴 때 변화했던 그 과정을 거꾸로 반복하는 시기에 접어들었음을 말한다. 걷기가 불편하나 어릴 때는 매일 앞으로 나가나 늙음은 뒷걸음치는 것을 스스로 느끼고 어릴 때 떼어 버렸던 기저귀는 다시 차야 할 시기가 다가옴을 어찌 막을 것인가. 그리고 스스로 걷지 못하면 도움을 받아야 하고 활기 넘치는 어린아이의 눈이 있는 모습과는 다르게 생기를 잃은 상태가 되는 것을 어찌 막을 것인가?
그리고 탄생의 뒤에 따라오는 죽음의 문턱에 들어오면 “아! 행복하고 즐겁게 소풍 왔다 가네”하고 읊조릴 수 있어야 할 터인데 그런 행운을 나 스스로 만들어야겠지. 처음이 있었으니 마지막 정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 이런 모든 변화를 조용히, 그리고 담담히 받아들이는 여유로움을 마음속에 간직해야 노후가 편안하고 오고 있는 변화를 즐길 수 있다.
신동화 전북대 명예교수
관련기사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식품저널 foodnews를 만나세요. 구독하기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