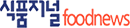신동화 명예교수의 살며 생각하며 (333)

모임에 참여한 사람들이 어느 주제를 공론화한 후 최종결정할 때는 다수결 원칙이 적용되는 것이 민주국가에서는 일반적인 경향이 되었다. 전제, 독재 국가에서는 독재자와 그 주위에 있는 몇 사람들의 의사가 그대로 반영되어 그들의 뜻대로 모든 것이 결정되어 일반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된다. 현대의 다수결이 의사 결정에 원칙으로 정해진 것은 고대 그리스와 로마에서 기원을 찾을 수 있으나 중세와 근대를 거쳐 점차 현대 민주주의 체제의 원칙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미국 독립(1776)과 프랑스 혁명(1789)을 거치면서 헌법과 법률제정 등 정책 결정에 이 원칙이 적용되었다. 지금은 세계 여러 민주국가에서는 의회에서, 혹은 대표자 선거 과정에서 다수결의 원칙은 핵심적인 의사 결정의 역할을 해오고 있다. 우리나라도 1948년 헌법이 생긴 이래 국민의 의사를 묻고 그 내용 결정하는데 이 원칙을 지켜왔으나 몇 번의 혁명 등에 의해서 민주주의의 대원칙이 훼손된 예를 보아왔다. 인간이 집단생활을 하면서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어떤 결정을 할 때, 모두의 의견을 묻고 결정하는 과정에서 다수가 지지하는 쪽으로 의사를 모으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 되었다.
그러나 이 다수결 원칙이 모두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게 된다. 한 가정에서 가족 구성원이 모두 참여하여 가족에 관계되는 일을 투표로 결정하기보다는 부모의 큰 원칙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으며 교육에서도 교사의 교육 이념이 수혜자인 학생의 의사 결정 이전에 더 중요하게 받아들여지는 것은 특수한 경우로 구성원의 지적 수준이 아직 완벽하게 구축되어 있지 않았을 때 이에 해당된다. 그러나 가장이나 교사들도 구성원의 의사를 존중하고 그 뜻을 따르는 경우도 있다. 거대 집단이나 구성원이 다양할 때는 선거를 통하여 지도자를 뽑거나 중요한 결정, 즉 헌법을 만들거나 수정할 경우 투표로 구성원의 의사를 묻고 이를 반영하는 것은 민주국가에서 아주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정착되었다. 그래서 대중의 의사는 옳다는 얘기가 회자되나 일부에서는 대중은 꼭 옳지 않다는 반론을 제기하기도 한다. 이런 부정적인 의견이 있음에도 다수결의 의사 결정 방법을 대체할 방법이 뚜렷하게 정립되지 않아 불완전하지만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알려진 대중의 의사 결정 방법으로 다수결은 몇 가지 불합리한 문제들도 있다. 우선 소수의견의 배제로서, 특정 소수자 집단이나 약자에게 불리한 결정이 내려질 수 있다. 특히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이면서, 소수인 이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기도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다수가 잘못된 정보에 몰입되어 있거나 특정 지역, 종교 등으로 이성적 판단보다는 패거리 문화에 오염되어 결정이 잘못되는 경우가 있다. 특히 지역적 편향성은 민주주의 다수결의 원칙에서 심한 약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집단이 감정적이고 충동적인 요소에 의해서 결과가 도출되면 진정한 대중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될 수가 없다.
다음으로는 집단적 사고의 문제다. 다수의 의견에 따르라는 무언의 압력은 자기 의사를 그대로 표현할 용기를 꺾어 버린다. 우리 국회에서 종종 일어나는 현상이다. 집단의 우두머리 의사에 반하여 행동하는 경우 내내 불이익을 받고 심지어 조직에서 축출되기도 한다. 집단이나 권력자의 폭거로 구분된다. 어떨 때는 다수결이 법적, 윤리적 기준보다도 우선되면 인권침해나 차별적 정책이 정당화되는 옳지 못한 결정에 이르게 된다. 인종차별이나 특정 집단의 권리와 이익을 박탈하는 불평등 결정을 할 수도 있다. 독일 히틀러 정권이 좋은 예이다. 우리나라에서 자주 일어나고 있는 양극화는 다수결의 큰 폐해 중의 하나이다. 단기적이고 현재의 자기 이익이 앞서면 이성적인 판단이 흐려지고 필요한 장기계획이 묻혀 버리는 우를 범할 수 있다. 대표자 선출에서 당장 나의 이익과 관계되는 것에만 빠지면 옳고 그름은 뒷전이고 먼 장래를 생각하지 않게 된다. 또한, 의사 결정 과정에서 내가 가진 불충분한 정보에 근거하거나 공정한 토론과정이 미흡하여 잘못된 판단에 이르게 될 수도 있다.
의사 결정을 할 사람의 수가 적을 때는 오랜 토론을 통하여 전원 합의제가 가장 바람직할 것이다. 신라 귀족들이 모여 합의 결정하는 화백 제도, 추기경들이 모여 교황을 선출방법인 콘클라베, 불교에서 의사 결정에 도입하는 대중공사는 전원이 의사 결정에 참여하여 토론하고 조정하여 완전한 합의를 이루는 과정이다. 현대 사회에서 적용하기는 어렵지만, 이 정신을 살려 대중의 진정한 의사가 결집되는 정치체제가 필요하다. 이러기 위해서는 개개인의 인격적 소양과 바른 마음가짐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나 어디까지나 이상이고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에 큰 괴리감을 느낀다.
신동화 전북대 명예교수
관련기사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식품저널 foodnews를 만나세요. 구독하기 클릭